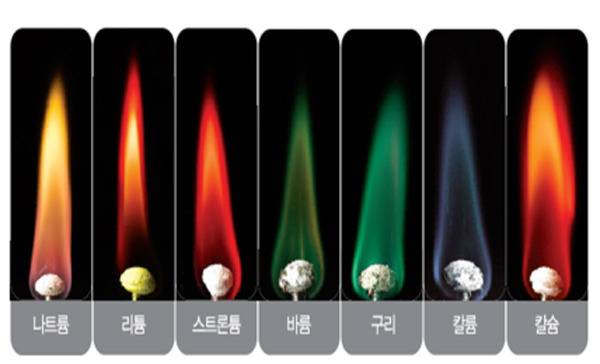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산업 현장과 농촌에서는 카바이트(탄화칼슘)를 활용한 불꽃이 흔히 목격됐다. 카바이트에 물을 떨어뜨리면 발생하는 아세틸렌 가스는 밝고 강력한 불꽃을 냈다. 당시 전력 사정이 열악했던 시기, 용접·절단·야간 작업용 조명으로 널리 쓰였다.
건설 현장에서는 철골 구조물 절단과 용접에 아세틸렌 토치가 필수 도구였다. 아세틸렌 가스는 압축 가스통보다 간편하게 현장 공급이 가능했다. 현장 막장에서 굴착 작업을 위해 설치한 간이 조명등도 카바이트 램프였다. 어두운 지하공간에서도 안정적인 빛을 제공해 작업 효율을 높였다.
농촌에서는 밤낮 구분 없이 작업해야 하는 벼베기·보리베기 철에 농부들이 들고 다니는 휴대용 램프가 있었다. 자루 끝에 설치된 램프통에 카바이트를 넣고 물을 방울방울 떨어뜨리면, 발끝 높이에서 밝은 불꽃이 수시간 지속됐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농촌 마을에서도 손쉽게 야간 작업이 가능했다.
그러나 안전 문제는 늘 뒷전이었다. 카바이트 램프가 넘어지거나 아세틸렌 누출이 일어나면 화재·폭발 사고로 이어졌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토치 용접을 하다가 주변 가연물에 불이 옮겨 붙는 사례가 잦았다. 1960년대 말부터 정부와 산업계에서는 가스통 용접기와 전력 용접기 보급을 확대하며 카바이트 의존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1970년대 중후반 전력 보급망이 전국으로 확장되고, 저압 가스 배관망이 구축되면서 카바이트 램프는 자취를 감췄다. 오늘날에는 박물관이나 영화 촬영 세트에서만 볼 수 있는 옛 풍경이 됐다. 하지만 전후(戰後) 혼란기와 산업화 초기의 고단한 작업 현장에서, 카바이트 불꽃은 어둠을 밝히고 노동을 이어 가는 동력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