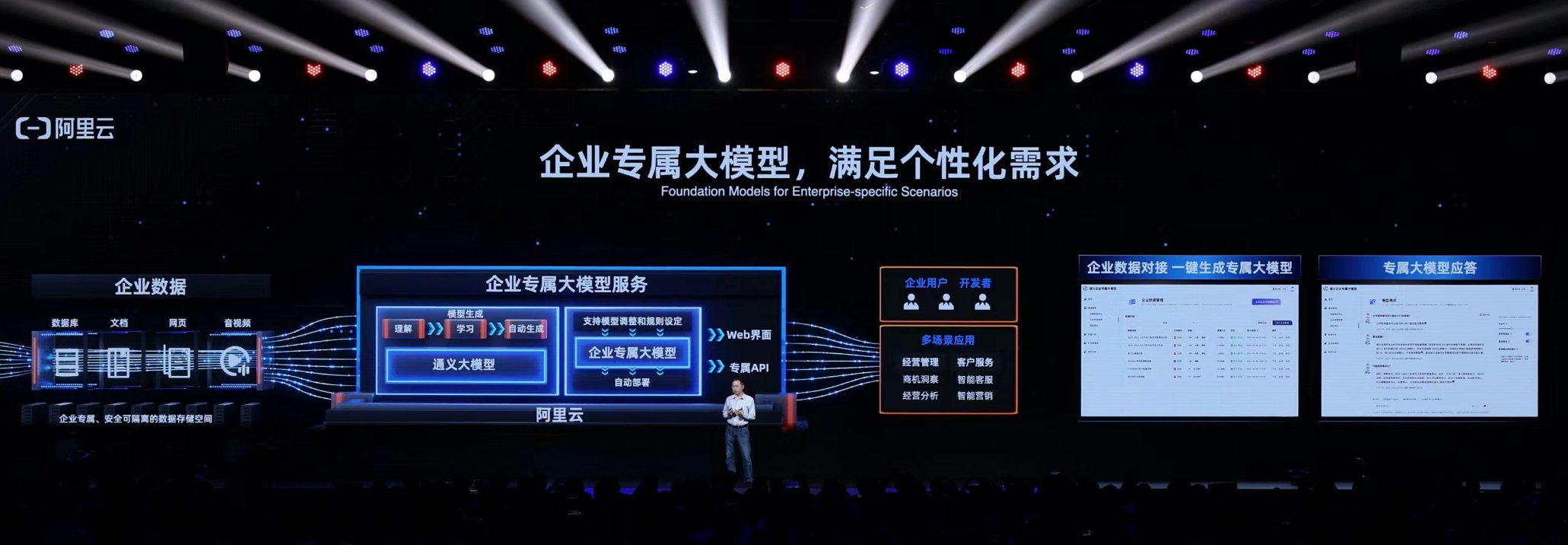올해 노벨경제학상은 필리프 아기옹, 피터 하위트, 조엘 모키르 세 학자에게 돌아갔다. 이들의 공통된 메시지는 분명하다. “경제성장은 기술이 아니라 제도와 문화가 만든다.” 혁신은 과학기술의 산물이기 전에 사회가 불확실성과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의 문제라는 것이다.
아기옹과 하위트는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개념으로 성장의 역동성을 설명했다. 새로운 기업이 기존 기술과 구조를 대체하며 일어나는 경쟁적 과정이 곧 혁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동시에 경고했다. 기득권이 과도한 이익을 독점하면 창조적 파괴의 ‘파괴’가 멈추고 ‘보존’만 남는다. 이때 경제는 안정 속에서 정체되고, 사회는 혁신의 에너지를 잃는다. 이미 시장을 장악한 은행 중심으로 금융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가 한국 경제에 해법이 될 수 없는 이유다.
조엘 모키르는 이런 이론의 역사적 토대를 제시했다. 그는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먼저 일어난 이유를 ‘지식의 개방과 문화적 포용’에서 찾았다. 영국은 프랑스보다 과학이 발전한 나라는 아니었지만, 장인과 기술자들이 높은 과학적 사고 수준을 지녔고, 그들의 실험과 실패가 사회적으로 수용됐다. 천재 발명가 몇 명이 아니라, 지식을 공유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산업혁명을 만든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한국 경제에도 깊은 함의를 던진다. 독점 규제는 반(反)기업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전제다. 시장 지배 기업이 과도한 이익을 누리면 혁신의 동기는 사라지고, 창조적 파괴의 선순환이 끊긴다. 공정경제란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개방이다. 새로운 기업이 도전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고, 실패가 곧 퇴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학습 가능한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정부의 혁신정책은 모키르가 강조한 ‘지식의 대중화’로 나아가야 한다. 기술혁신은 대기업 연구소가 아니라 공대생의 실험, 중소기업의 현장 개선, 지역의 문제 해결에서 태어난다. 정부는 자금 지원 중심의 연구개발을 넘어, 사회 전반에 과학적 사고와 실험정신이 스며들도록 제도와 문화를 설계해야 한다. 산학연 협력을 단순한 위탁 관계가 아닌 ‘공동 학습 네트워크’로 바꾸고, 실패를 제재가 아닌 학습으로 인정하는 회계·법제 개편이 필요하다.
혁신은 ‘허가제’가 아니라 ‘학습제’다. 제도는 위험을 억누르는 장치가 아니라, 위험을 관리하며 새로운 실험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아기옹과 하위트가 말한 경쟁의 순환, 모키르가 보여준 개방적 문화는 결국 같은 메시지를 전한다.
“기술은 이미 준비됐다. 남은 것은 제도와 문화의 용기다.”